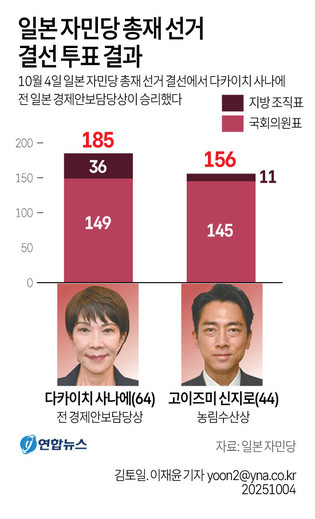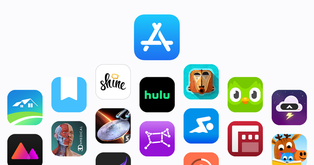속초11.5℃
속초11.5℃ 북춘천15.4℃
북춘천15.4℃ 철원12.9℃
철원12.9℃ 동두천14.6℃
동두천14.6℃ 파주13.1℃
파주13.1℃ 대관령7.4℃
대관령7.4℃ 춘천15.1℃
춘천15.1℃ 백령도12.2℃
백령도12.2℃ 북강릉11.7℃
북강릉11.7℃ 강릉12.6℃
강릉12.6℃ 동해12.7℃
동해12.7℃ 서울16.1℃
서울16.1℃ 인천15.9℃
인천15.9℃ 원주15.1℃
원주15.1℃ 울릉도13.3℃
울릉도13.3℃ 수원15.5℃
수원15.5℃ 영월13.6℃
영월13.6℃ 충주14.1℃
충주14.1℃ 서산14.0℃
서산14.0℃ 울진12.7℃
울진12.7℃ 청주17.0℃
청주17.0℃ 대전15.9℃
대전15.9℃ 추풍령14.0℃
추풍령14.0℃ 안동14.1℃
안동14.1℃ 상주15.2℃
상주15.2℃ 포항16.3℃
포항16.3℃ 군산15.8℃
군산15.8℃ 대구15.5℃
대구15.5℃ 전주16.9℃
전주16.9℃ 울산14.8℃
울산14.8℃ 창원18.2℃
창원18.2℃ 광주17.2℃
광주17.2℃ 부산16.8℃
부산16.8℃ 통영17.9℃
통영17.9℃ 목포16.1℃
목포16.1℃ 여수18.6℃
여수18.6℃ 흑산도15.0℃
흑산도15.0℃ 완도16.7℃
완도16.7℃ 고창14.4℃
고창14.4℃ 순천15.8℃
순천15.8℃ 홍성15.6℃
홍성15.6℃ 서청주15.4℃
서청주15.4℃ 제주21.1℃
제주21.1℃ 고산19.3℃
고산19.3℃ 성산19.6℃
성산19.6℃ 서귀포20.5℃
서귀포20.5℃ 진주15.3℃
진주15.3℃ 강화15.3℃
강화15.3℃ 양평14.3℃
양평14.3℃ 이천14.5℃
이천14.5℃ 인제11.8℃
인제11.8℃ 홍천14.5℃
홍천14.5℃ 태백9.2℃
태백9.2℃ 정선군12.3℃
정선군12.3℃ 제천14.0℃
제천14.0℃ 보은14.4℃
보은14.4℃ 천안15.5℃
천안15.5℃ 보령15.2℃
보령15.2℃ 부여16.4℃
부여16.4℃ 금산15.6℃
금산15.6℃ 세종15.7℃
세종15.7℃ 부안16.2℃
부안16.2℃ 임실16.9℃
임실16.9℃ 정읍15.7℃
정읍15.7℃ 남원16.6℃
남원16.6℃ 장수14.4℃
장수14.4℃ 고창군14.3℃
고창군14.3℃ 영광군℃
영광군℃ 김해시16.6℃
김해시16.6℃ 순창군15.7℃
순창군15.7℃ 북창원18.6℃
북창원18.6℃ 양산시16.7℃
양산시16.7℃ 보성군16.7℃
보성군16.7℃ 강진군17.8℃
강진군17.8℃ 장흥18.3℃
장흥18.3℃ 해남15.6℃
해남15.6℃ 고흥17.0℃
고흥17.0℃ 의령군15.0℃
의령군15.0℃ 함양군15.4℃
함양군15.4℃ 광양시17.5℃
광양시17.5℃ 진도군16.2℃
진도군16.2℃ 봉화12.5℃
봉화12.5℃ 영주13.8℃
영주13.8℃ 문경13.9℃
문경13.9℃ 청송군13.2℃
청송군13.2℃ 영덕13.8℃
영덕13.8℃ 의성14.8℃
의성14.8℃ 구미15.4℃
구미15.4℃ 영천15.1℃
영천15.1℃ 경주시14.6℃
경주시14.6℃ 거창15.0℃
거창15.0℃ 합천16.2℃
합천16.2℃ 밀양16.9℃
밀양16.9℃ 산청14.6℃
산청14.6℃ 거제17.7℃
거제17.7℃ 남해17.8℃
남해17.8℃ 북부산16.9℃
북부산16.9℃

▲경향신문 1969년 8월 20일 자 신문은 ‘비만 오면 고립되는 잠원동 일대’ 소식을
르포 형식으로 소개했다.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서울 강남 잠원동과 반포동,
한남동 일대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모습이라 50년 전의 신문 기사 한 토막이 많은 추억을 되새기게 한다.
ⓒ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
날마다 나룻배 타고 출퇴근
뱃길 없을 땐 10일 길 걸어야
직장 학교 빠지기 일쑤
개통될 제3한강교에 기대
서울 영등포구 잠원동의 한강나루터는 요즈음 새벽 5시만 되면 출근 시간의 버스정거장처럼 혼잡해지기 시작한다. 이것은 장마 끝에 거의 한 달 만에 트인 뱃길. 이 나루터는 영등포구 반포동, 잠원동과 성동구 신사동의 3천여 주민들이 서울에 나다니는 유일한 교통로다.
그러나 장마로 강물이 불어나자 한 달 남짓 뱃길이 끊겼었고 앞은 한강에, 옆과 뒤는 하천지대로 둘러싸인 이곳 주민들은 꼬박 고립된 섬 생활을 해왔다. 이곳 주민 중 매일 시내에 나와야 되는 학생 공무원 등은 1천여 명. 뱃길이 없을 때는 최소한 10여리 길을 걸어 동작동 끝 이수교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야 된다.
서울 모 제약회사에 다니는 신사동 259 안모 씨는 “올해는 1개월을 꼬박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. 동료들에게 이곳 사정을 얘기하면 서울에도 그런 곳이 있느냐“고 믿지 않는다는 것. 한강 건너 한남동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김 모군은 ”지난 7월 17일 1학기말 시험 중인데 나룻배가 건너지 않아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“면서 ”학교에서는 나룻배가 건너지 못한 것을 알면 미리 결석으로 줄을 그어놓는다“고 쓴 웃음이다. 학교에서 자기 별명은 ‘강건너’라고.
이곳 서울의 섬 주민들은 그동안 숱한 시련을 견디어 왔다. 지난 64년 7월, 65년 7월에는 물이 동네를 뺑 돌아 침수, 헬리콥터로 집을 물속에 남겨둔 채 긴급 구출되기도 했고, 나룻배가 강물에 잠긴 케이블에 걸려 전복되기도 했다.
6년 동안 이곳에 살아온 잠원동 박모 여인(41)은 남편과 애들이 아침 출근을 할 때는 강가에 나가 무사히 배가 강 건너 한남동에 닿는 것을 보고서야 집으로 돌아온다면서 밤에 조금만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도 걱정이 되어 몇 번이고 나루터에 나가본다고 했다. 용산서 한남 파출소 전진하 소장은 밤 11시면 나룻배가 끊어지는데 강 건너 주민들이 "배가 가지 못하니 잘 곳이 없다"고 파출소를 찾아올 때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.
숱한 고달픔을 견뎌낸 이 서울의 섬 주민들은 올해 안에 개통될 제3한강교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다. 시내버스가 들어올 게고, 땅값도 다시 뛸 것이고. 30여 년 동안 이 나루터를 지켜온 나룻배 선주 김영배 씨(54)는 “사실 도선료 10원씩 벌자고 이직을 하는 것은 아닙죠. 그저 천직인 것 같아서…” 하며 쓸쓸한 표정이다.(경향신문 1969년 8월 20일 자)
[저작권자ⓒ 뉴스타임스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]